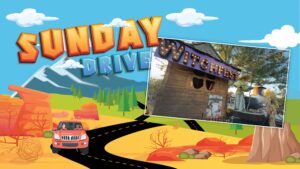헐버트 기념재단의 귀환: 고종이 선물한 자개 장식장
1 min read
서울에 위치한 헐버트 기념재단 본부에는 호머 B. 헐버트(1863-1949)의 고유한 유산으로 자리 잡은 자개 장식장이 있다.
이 장식장은 170cm가 넘는 높이에 여러 가지 섬세한 꽃과 나무, 풀, 동물의 모티프가 장식되어 있으며, 평범한 용도로 제작된 가구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수준의 손 craftsmanship으로 제작되었다.
이 장식장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인 고종으로부터 헐버트에게 선물된 것으로, 정확한 시점이나 상황은 불분명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주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징적인 선물은 두 사람 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며, 헐버트는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선교사이자 교육자로, 한국의 격변기를 거치며 왕실의 자녀들과 귀족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헐버트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을 위한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를 저술하였고, 한국에 대한 영어 저널과 정기간행물을 출판했다.
그는 고종의 측근으로 일본의 영향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고, 고종이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에게 독립 노력을 전하길 원했던 편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헐버트는 현대 한국 국가 기초에 기여한 공로로 사후에 존경받았다.
이 장식장이 헐버트에게 소중한 기념으로 여겨졌던 만큼, 그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롭다.
헐버트의 자개 장식장은 여러 대륙을 넘나들며 박물관을 거쳐 본래의 제작국인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장식장이 어떻게 귀환했는지 그 여정 또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전문가인 김삼대자에 따르면, 이 장식장은 19세기 후반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문가는 “통영은 자개와 칠기 산업의 중심지로, 그곳 장인들이 이 분야에서 전문화를 이루었다”며, 당시 가장 뛰어난 자개 장인으로 알려진 엄성봉이 이 장식장의 제작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종은 외국 귀빈을 위해 고품질의 선물을 제작하기 위해 항상 최고의 장인들을 의뢰했다.
현재 이 장식장과 유사한 장식장은 두 점만 남아 있으며, 하나는 세종문화회관에 기증된 헨리 앱젠렐러의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동양미술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앱젠렐러가 소장하던 장식장은 지난 9월 25일에 국가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조선 왕실과 서양 선교사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독특한 유물로 평가받았다.
장식장을 소장하고 있던 헐버트의 손자이자 킴벌의 아버지인 리차드는 장식장과 함께 남긴 손편지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공물로 보내졌다. 한국 왕에게 반환됐다”며, 불분명한 날짜의 기록을 남겼다.
그는 또한 “빅토리아와 알버트 박물관에 오랜 시간 동안 보관되었다”라고 기록했다. 실제로 이 장식장은 런던의 빅토리아와 알버트 박물관에서 5년 넘게 전시되었다.
헐버트는 1899년 초, 자개로 장식된 한국의 장식장과 자수 중국 스크린을 미국에서 남켄싱턴 박물관으로 보내 검토를 요청했지만, 박물관은 손상 문제로 인해 구매를 거부하였다.
손상을 이유로 자개 장식장은 대여 형태로 제공되었고, 1899년 7월에는 박물관의 동양 섹션에서 전시되었다.
김동진 헐버트 기념재단 회장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1898년, 헐버트는 한국 제국이 프러시아의 하인리히 왕자의 방문 준비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며,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장식장을 들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와 알버트 박물관에 따르면, 장식장은 1906년 초까지 전시되었으나, 헐버트는 1906년 3월 2일에 자신이 살던 앤도버, 매사추세츠에서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대리인에게 송부를 승인했다.
이 물건들은 1906년 4월 5일에 발송되었으며, 박물관에서는 ‘반환됨’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는 해당 장식장이 들어오는 기록이 없다.
헐버트는 금속 활자의 모음들을 제공했으나, 대형 가구는 남기지 않았다고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인류학 큐레이터 로렐 켄달이 확인했다.
거의 동일하게 명칭이 같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헐버트와 관련된 한국 유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식장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캐리 비쇼프가 말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1893년, 1899년, 1901년 동안 헐버트로부터 팬, 의복, 신발, 도자기, 갑옷, 심지어 인력거까지 다양한 한국 유물을 수집하였지만, 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비쇼프는 “대출된 물건들이 공식적으로 소장되면 좋겠지만, 기록이 없을 경우도 많다”며, 장식장이 전시되었지만 정식으로 수집되지 않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결국 이 장식장은 헐버트 가문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의 세부사항과 시점은 불분명하나, 헐버트의 고손자인 킴벌을 포함한 후손들이 소유하게 되었다.
킴벌은 뉴욕의 라이 거주 당시 가정에서 이 장식장을 소중한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가 저녁을 함께 하는 장소에서 중심적인 부분이 된 장식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장식장이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의 어머니는 여러 번 이사를 했지만 항상 가정과 함께 장식장을 옮겼으며, 최근에는 불가피하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킴벌은 “이 아름다운 가족 역사의 일부분을 간직하고 싶었지만, 뉴욕시에 살 형태 때문에 이 장식장을 제가 소유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념재단의 김동진 회장과 잘 알고 있기에 이 장식장이 그 사람에게 보관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기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장식장은 기념재단 본부에 보관되고 있으나, 킴벌은 이 장식장이 전문적인 보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이미지 출처:korea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