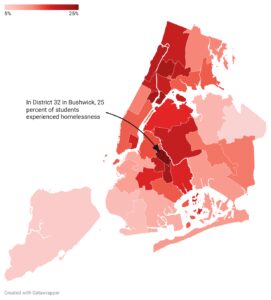트럼프 대통령, APEC 정상회의에서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의문
1 min rea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 기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션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의 대규모 경제 국가 리더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귀중한 포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대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 회담은 무역 전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공식 성명보다 더 중요한 실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재고는 더 커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기 전에 김 위원장이 진정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회동은 그 자체로 상당한 양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언어를 빌리자면, 김 위원장과의 회의에서 ‘카드’를 가지고 있다.
가장 명확한 카드는 바로 회의 자체의 수용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이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상회의에서 고유한 위엄을 부여한다.
이러한 중요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름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동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설명한다.
그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자신의 지위의 위엄을 군사적 제국에 빌려주는 것이었다.
비슷한 비판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김 위원장과 최초로 만났을 때도 제기되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미국을 향해 위협을 가한 바 있으며, 그 중에는 핵 위협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만남의 위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했다.
이러한 회의는 북한처럼 작은 고립된 독재국가에 대해 특히 선전 효과가 있다.
북한은 한국, 즉 미국의 동맹국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다.
미국은 그 특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북한의 정당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기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이 합법적인 핵 보유국이며 논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막대한 양보가 된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핵무장을 하였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반복적으로 제재했다.
북한은 갈등이 발생 시 핵무기를 선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무기 보유국이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막대한 문제를 간과하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 대가는 의미 있는 비핵화 협의이거나,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에 대한 제약과 같은 비핵적 양보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열린 트럼프-푸틴 정상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이 강자에게 승인을 구하는 것처럼 비춰질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 회의는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줄 만한 것이 무엇인지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에 만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김 위원장과의 우정을 이용해 양보를 이끌어낼 기회를 가져야 한다.
양측 간의 전략적 신뢰는 낮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거래의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연 이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저자: 로버트 켈리 박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국제관계 교수인 로버트 E. 켈리 박사는 동아시아의 안보, 미국 외교 정책, 국제 금융 기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는 외교 문제에 대한 논문을 《Foreign Affair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그리고 《The Economist》와 같은 매체에 게재했으며, BBC 및 CCTV와 같은 방송사에서 토론한 경험이 있다.
이미지 출처:nationalsecurityjournal